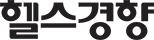그는 3년 전 입국했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듯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몸이 좀 아파도 참아가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식구들에게 돈을 보냈을 것이다. 그는 이번 통증 역시 조금 그러다 말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통증은 없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가 병원에 온 것도 주위의 강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간을 만졌을 때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진찰결과나 혈액검사에서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다. 스물다섯의 젊은 나이였으니 간암일 리도 없었다. 그래도 간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 의사는 상복부 CT를 찍었는데 그 결과 10x9 cm 크기의 커다란 주머니가 간에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 환자 역시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증상이 나타났으니 우즈베키스탄에서 걸려 온 게 틀림없는데 주머니의 크기로 미루어 보아 대략 7-10년 정도 몸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주머니가 생기는 위치는 간이 가장 흔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간이며 폐가 그 다음이다. 그밖에 눈, 뇌, 복강, 신장 등 몸 어디에도 생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치료는 수술로 제거하는 게 가장 좋고 이 환자 역시 수술로 주머니를 제거한 뒤 건강하게 살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포충증은 대개 중동에서 걸려온 것들이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포충 유행지인 중동에 가서 감염이 되고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만큼 소득수준이 증가한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노동자가 외국에서 감염된 증례는 거의 없어졌고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 나라에서 걸려오는 증례만 발생하고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 노동자들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다가 주머니가 일정 크기 이상 커졌을 때 발견된다.
포층증은 소나 양이 중간숙주고 개가 종숙주로 사람은 개의 변에서 나오는 알을 어떤 경로로든 먹게 되면 감염된다.

유행지에서는 개들이 소나 양의 장기를 쉽게 먹을 수 있어 개의 감염률이 높다. 주로 외국에서 걸려온 환자가 주를 이루지만 포충증은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던 기생충이다.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