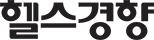국내에 도입된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미국 의료기관인증제도와 상당부분 유사한데 이 때문에 도입 초기 당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평가방식이 다분히 형식적이라면 인증제는 실질적인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 하지만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율인증’을 기치로 시작된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점점 ‘강제인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인증이 장삿속으로 전락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니 도입 당시에 우려하던 일들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그렇다면 도입 당시의 우려란 무엇일까? 미국의 인증제는 사보험 시장에서 보험사가 병원과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한다. 미국 병원의 경우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보험사와의 제대로 된 계약은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인증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불량가입자와 우수가입자의 기준이 되는 병원의 질적인 수준을 가늠할 길이 없으니 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보험 시장이 아닌 의료기관의 질적인 상태가 보장돼도 시장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태생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인증 받았다고 수가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어렵고 돈만 드는데 자율신청이라고 했으니 심드렁한 것이 당연하다.
반면 정부는 기존의 병원평가제를 대신하다 보니 모든 병원이 받아야만 하는 정치적인 문제에 빠진 것이다. 또 인증제는 원래 평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 시까지의 과정, 즉 컨설팅을 통해 질적으로 좋은 병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노력한 보람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해 인터넷 강의를 받고 비싼 돈 내고 시험 치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의료는 제도가 아닌 문화이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효과를 봤다고 해도 우리에게 맡지 않으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무작정 제도를 도입한 대담함은 이제 제도 실행 후 부작용을 걱정할 처지가 됐다. 제도와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남이 수십 년 걸쳐 완성한 제도를 단시일 내 이루려 한 욕심이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를 망치고 있는 것 같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