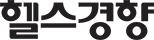2009년 3월 필자는 부푼 꿈을 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대학병원으로 장기해외연수를 떠났다. 당시에는 식도암수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소침습 식도암수술로 가장 유명한 Luketich 교수에게 무작정 연수를 가겠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현장에서 두 달 정도 수술을 지켜봤지만 이대로 연수를 마치면 대학병원 교수로서 갖춰야 할 연구역량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안 가도 되는 여러 모임에 일부러라도 참석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 우연히 연구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됐다. 바로 Toyoda 교수가 심폐이식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새로 만든 연구실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연구실의 PI(Principal Investigator: 연구총괄책임자)는 일본에서 외과를 전공한 Nakao 선생님이었다. 그는 10년째 미국에서 소동물연구실험을 하고 있는 베테랑이었다. 필자는 인턴부터 전공의, 펠로우, 교수과정까지 임상분야는 열심히 했지만 연구분야는 전혀 경험이 없어 모든 것이 새로웠다. 보통 해외연수를 가면 한국에서보다 더 여유롭게 지낸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인턴 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냈다.
연구실에서는 주로 쥐(Rat)를 모델로 이용해 심장이식수술을 했다. 필자의 첫 임무는 공여자(Donor)로부터 심장을 얻어서 수혜자(Recipient)에게 심장을 이식할 때까지 심장보존시간이 오랜 걸리는 경우 어떤 심장보존액을 썼을 때 더 심장기능이 잘 보존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BST(Biomedical Science Tower)에서 근무했는데 이곳은 세계 최초로 간이식을 한 Starzl 교수가 근무했던 곳이다.
기본 술기는 공여하는 쥐를 흡입마취해 가슴을 열고 심장을 적출, 심장보존액을 주입해 보존한 뒤 일정 시간 후 수혜쥐의 배를 열어 1.5mm정도 되는 복부대동맥에 적출한 심장의 대동맥을 연결하고 하대정맥에 폐동맥을 연결하는 것이다. 쥐의 심장을 수술할 때는 현미경을 사용하고 봉합사는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가는 실을 사용한다. 의과대학 시절 조직학시간에 현미경을 본 이후 거의 15년 만에 사용하는 터라 가뜩이나 낯설었는데 미세봉합수술 또한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혼자 쥐를 마취하고 마취 깊이도 틈틈이 확인하면서 미세봉합수술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요구됐다.
부교수 승진 후 연수를 갔던 터라 임상수술에서는 나름 자신이 넘쳤을 때였는데 쥐 수술은 초짜였기에 마취사고도, 출혈로 인한 사고도 있었다. 이를 지켜본 PI는 정말 외과의사 맞냐며 핀잔을 줬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지만 참고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거의 120건의 심장이식수술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침저녁으로 회진을 돌면서 체중을 재고 이식 후에는 면역억제제도 주사하며 이식한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또 이식한 심장기능이 멈추거나 일정기간 후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한 심장을 적출, 절반은 포르말린에 보존해두고 일부 조직은 액화질소에 얼려 보관한다. 혈액을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혈청만 분리해 초저온냉장고에 저장해둔다. 조직면역화학염색도 직접 한 후 현미경으로 염증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염색이 얼마나 되는지 등 병리과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뿐 아니라 채취한 조직이나 혈청을 통해 mRNA를 보는 PCR검사나 단백질을 보는 western blot과 같은 검사도 직접 해야 했다.
검사는 하루종일 또는 이틀에 걸쳐 이뤄지는데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일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서야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검사결과 중 연구가설에 맞는 결과는 일부분이어서 쓸 만한 결과인지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거의 매주 실험미팅을 통해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실험가설에 맞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 연구성과를 관련 학회에서 발표하고 코멘트를 듣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국제학술지에 투고해 리뷰를 받은 후 추가 실험 등 수정의 과정을 반복한 이후에 겨우 하나의 논문이 완성된다. 어찌 보면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해야 할 연구설계, 실험, 논문화과정을 1년 만에 압축해 단기속성으로 마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할 의학자로서의 기본연구능력을 미국에서 일본사람에게 배운 꼴이다.
무엇보다 연수생활에서 크게 와닿았던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연구능력 차이다.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 다음 군의관 또는 공보의 3년을 거친다. 이후 펠로우 과정 2년 뒤 조교수에 임용된다. 조교수에 임용된 후에도 열심히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보고 지칠 때쯤 1~2년간 장기해외연수를 가게 된다. 대학원 석·박사과정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겨우 이수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의과정을 거친 다음 종합병원에서 독립된 외과의사로 2~3년 임상업무를 한 후 연구를 원하면 임상업무를 하지 않고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4년간 연구에만 집중해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후 미국유학을 통해 박사후과정을 수행하는데 이때 추가연구를 통해 눈에 띄는 연구성과를 이뤄야만 대학에서 교원이 될 수 있다. 교수 임용 전 절실할 때, 또 우리보다 적어도 5년은 젊을 때 유학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다. 연구력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또 일본의 대학병원은 어려운 환자치료와 연구를 담당하고 일반 환자의 수술과 치료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벼운 질환조차도 대학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대학병원 본연의 연구업무를 도통 잘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환자 진료 외에 연구까지 잘하기를 요구하지만 아예 연구에 대한 기본을 익히기 어려운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은 이러한 점에서 좀 합리적이다. 교수가 자신의 업무비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업무만 100% 하는 교수’ ‘임상 90%와 연구 10%’ ‘임상 10%와 연구 90%’ ‘연구만 100%’ 등 개인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정해서 그에 맞게 계약하고 수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손 기술이 좋아 임상업적에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참 아쉽다. 인프라와 교육 수련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