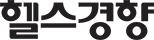ㆍ전체 치매환자의 20% 가량이 65세 미만
ㆍ자녀 유전확률 100%·가정경제도 직격탄
ㆍ보호자 대상 질병관리교육 등 실시 시급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가족을 지치게 만드는 질환’. 바로 치매다. 아직까지 ‘치매는 고령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초로기 치매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 분석결과 2011년 8088명이었던 초로기 치매환자는 2014년 8881명으로 늘었다. 대한치매학회는 전체치매환자의 20%가 65세 미만이라고 보고 있다.

발병원인은 외상성뇌질환, 뇌혈관질환 등 다양하지만 알츠하이머가 절반 이상이다. 치매는 유전력이 강해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PSEN1, PSEN2, APP 등 치매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65세 이하 조발성 알츠하이머치매환자에게서 발견된 이 유전자를 자녀가 갖고 있을 때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은 100%.
초로기 치매가 노인치매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40~50대에 치매가 발병하면 가정경제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는 “초로기 치매로 인해 업무능력이 떨어진 중장년은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환자가 가장인 경우 가정수입이 사실상 끊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매시설입소도 문제다. 이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드물어 가정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민주 사무관은 “2014년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초로기 치매환자도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시설입소는 연령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초로기 치매정책은 3차에 걸친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개선되고 있다. 치매확정 시 초로기 치매환자도 치매노인과 동등하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 김기웅 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65세 이상 환자보다 중장년치매환자와 가족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법상 이를 모두 보전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로기치매환자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보호자가족은 치매환자 1인당 200만원의 인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요양비지출, 건강보험 의료비지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한치매학회 김상윤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는 “초로기 치매로 인해 자녀교육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면 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한다”며 “부모의 치매발병소식을 들은 자녀는 큰 충격을 받고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교육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처럼 치매정책개발과 연구를 총괄하는 기관이 개설돼야한다”며 “1차기관 검진 시 초로기치매증상이 뚜렷한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안내하는 전달체계도 확립돼야한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