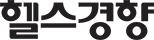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리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환자들의 무의식에선 종종 이 같은 모순이 관찰된다. 의사에겐 “왜 이렇게 안 낫죠”라며 답답해하지만, 무의식에선 ‘병이 너무 빨리 나으면 어떡하죠’라고 걱정하고 있다.
발목을 접질려 내원한 여고생 ㄱ양. 6개월 사이 벌써 다섯 번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두 학원에 가던 길에 책을 보며 걷다가 삐끗했다. 보호자 말대로 그냥 발목 인대가 약한 것일까. 아니면 촌각을 아끼며 공부하려다 생긴 단순 부주의일까.
무의식적 회피다. 차라리 발목을 삐끗하면 답답한 학원과 공부에서 잠시라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공부에 열성적이지만, 무의식에선 정반대의 욕구가 읽힌다. 발목염좌는 우연을 가장한 무의식의 방조인 셈이다. 그래서 삐끗해도 매번 당황하거나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은 없다.
불면증과 전신쇠약을 호소하는 ㄴ할머니. 수면제에 신경안정제까지 용량을 늘렸지만 잠을 못 이룬다. 위장장애며 아픈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특히 팔다리 무력감을 강하게 호소했다. 뇌 촬영까지 했지만 역류성 식도염 진단만 받았다. 환자는 이 모든 게 갑작스레 찾아온 불면증 탓으로 여겼고, 어떤 치료로도 호전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대신, “빨리 나아야 손주도 봐줄 텐데…”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무의식은 정반대다.
내 병이 나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손주를 봐야 할 게 걱정이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야 한다. 팔다리에 힘도 없어야 한다.
신체기능의 상실은 고통스러운 또 다른 현실로부터 도피할 합리적 명분이다. ‘난 더 이상 손주를 볼 수 없어!’라는 무의식의 강력한 시위다. 그러나 보호자는 물론 환자 본인도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
할머니는 5년간 친손자 양육을 끝냈더니, 곧이어 딸이 외손자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불면증은 할아버지가 덥석 승낙한 이후에 생겼다. 할머니는 “지난 세월 내 인생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야 한숨 돌리나 했는데 다시 외손자를 떠맡으라니, 할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친손자는 봐줬는데 외손자는 어떻게 거절해’라는 양심이 할머니를 다시 괴롭혔다. 결국 거절은 차마 못하고, 대신 불면증이 온 것이다.
그야말로 할머니는 아파야 산다. 아프고 싶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난다.
할머니에게 정작 필요한 의사의 진단은 ‘불면증’도 ‘역류성 식도염’도 아니다.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몸이 회복된 뒤에도 건강상 손자 양육은 앞으론 절대 무리라는 단호한 소견이다.
몸이 좋아져봐야 오히려 ‘감옥 같다’고 느끼는 더욱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다린다면, 결코 몸이 나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각성제처럼 더 말똥해지는 거짓말 같은 상황이 실제 생긴다. 소화제를 먹었는데 소화가 더 안되고, 두통약이 함께 처방되었는데 오히려 머리가 더 아파진다.
성적 저하나 취업 실패로 힘겨운 학생과 청년들, 가정사로 골치 아픈 주부들, 현실을 벗어나고픈 가장들, 너나없이 자신의 마음을 놓치면 이 같은 모순에 빠져든다. 그들만의 다양한 사연을 간직한 채 딜레마 속에 갇혀버린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아프고 싶고, 아파야만 살 수 있다는 자기모순의 최면에 걸려 있다.
병원은 그들에게 그럴듯한 병명은 붙여주지만 정작 제대로 치료해주긴 힘들다. 의사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낫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꽁꽁 숨어버린 채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자기모순을 발견하고,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