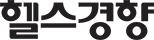기나긴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학술대회가 한창이다. 학회별로 개최시기는 물론 프로그램도 다르지만 소속 회원들도 다시금 열린 소통의 장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온라인으로 서로의 임상경험과 노하우, 질환의 최신지견들을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 실습 프로그램이 필요한 외과분야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물론 기자들에게도 취재 기회는 열려 있다.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직접 연간 학술대회 일정을 볼 수 있고 학회 측에서 언론홍보를 원하는 경우 직접 초대 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올해는 학술대회 대부분이 대면으로 개최되면서 기자도 여러 학술대회를 두루 취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쌓인 경험만큼 아쉬움도 늘어났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북. 의학분야이다 보니 프로그램 북은 대부분 영어로 돼 있는데 문제는 국제학술대회가 아닌 경우에도 한글본이 없다는 것. 발표 역시 영어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정보전달자로서 학회에 참석한 기자 입장에선 현장 내용들을 정확하게 녹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기사 송고 전 학회 측에 팩트 체크(사실 확인)를 요청해도 “기자들이 참석하는 학회가 아니라 자료나 답변을 바로 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되돌아온 적도 있다.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기자에게는 매우 곤란한 상황. 결국 시간에 쫓겨 쓰고 싶은 내용을 다 못 담은 적도 많다.
두 번째는 먼저 취재요청이 와서 학술대회에 참여해도 정작 현장에 참석 기자가 있는지, 있다면 현 강연내용에서 질의사항은 없는지 따로 전문가들과 소통할 시간이 없다는 것. 물론 학술대회기간 기자간담회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는 학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책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사항이 있어 언론을 소통 매개체로 삼아야 할 때뿐이다. 웬만해선 의사들을 위한 강연과 실습 프로그램 위주이다.
학회 현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음 강연시간에 쫒겨 급히 이동해야 하다 보니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 않다. 설령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인터뷰 도중 회원들 간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아 흐름이 끊기는 일도 다반사이다.
세 번째는 학회 사무국의 대응. 기자로 참석했다고 하면 일단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학술대회 전 사무국에 문의했을 때 기자는 현장등록을 하면 된다고 답변했는데도 말이다. 한참을 서로 우왕좌왕하다 ‘비회원’ 또는 ‘PRESS’라고 급히 인쇄된 이름표를 걸고 겨우 입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과정을 마주하면 사실 취재 전부터 힘이 쭉 빠진다.
위의 사항들은 기자가 느낀 아쉬운 점일 뿐 다른 기자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모이는 학술의 장이라고 해도 취재 기회가 엄연히 열려 있다면 기자가 정확히 취재할 수 있는, 또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소통창구는 최소한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술대회 취재는 분명 기자에게도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원동력이다. 주말에도 학구열을 불태우는 의사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된다. 하지만 위의 문제들에 봉착하면 마치 의사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발을 들이고 온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내년에는 기자와의 소통창구도 활짝 열린 학술대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