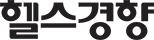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보고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등을 통해 강력한 신약개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선언이 무색하게 제약사의 기술수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31일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차바이오텍, SK바이오팜, 종근당 등 5건의 기술수출이 있었다. 또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수출 규모는 총 18건, 6조6326억원 수준이었다.
기술수출이란 기술을 다른 곳에 이전하는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 L/O)’의 다른 말이다. 실제로 국내 제약기업은 혁신 신약(First-in-class)이 될 수 있는 후보물질을 발굴, 끝까지 개발하기보다 그 물질에 대한 권리를 해외 제약사에 중도 이전하거나 개발 수익 일부를 보상받는다.
일종의 자발적 ‘기술유출’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은 라이선스 아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심지어 국내 신약개발 벤처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외국기업에 넘기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2020년 약 10조원이 넘는 기술수출을 달성했다. 물론 이처럼 기술수출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는 제약사들의 꾸준하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원천기술이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신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신약개발부터 생산 및 글로벌 수출로 이루어지는 전주기 신약개발의 사례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인 것.
기업들이 라이선스 아웃을 목표로 한 이유는 임상3상 때문이다. 제약산업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다. 임상3상이 잘못되면 글로벌 빅파마 역시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을 입는다. 이에 제약 강국인 미국은 여러 제도를 통해 전주기 지원,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임상3상 실패 시 일부 금액을 보상해주기까지 한다.
임상3상까지 수익을 낼 수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임상3상의 실패와 성공의 책임은 오롯이 제약기업의 몫이다. 또 임상3상에 성공해도 약가협상단계에서 금액이 낮게 책정된다. 결국 제약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임상1·2상 후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존재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품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보험 등재와 같은 규제과학 지식이 요구되는 규제산업이다. 하지만 인력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약산업은 보건·사회·과학·경제 등이 얽혀 있는 종합적인 비즈니스지만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단절돼 있다. 규제도 각 부처마다 다르다. 따라서 제약산업 지원정책을 만들 때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가 따로 할 게 아니라 모두가 모여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농부가 귀중한 재산인 소를 잃고 후회하며 외양간을 고친다는 이야기로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키울 수 없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제약산업은 이제 국력이다. 국력이 약한 국가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오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