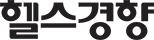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좀 샀으면 좋겠군.”
미국의 작가 E.헤밍웨이가 집필한 소설 ‘노인과 바다’의 한 문구다.
소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쿠바의 작은 어촌에서 고기 낚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이다. 젊은 시절 그는 솜씨 좋은 어부였다. 하지만 세월과 더불어 힘이 다했는지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품지 못했다. 85일째 되는 날 먼 바다로 나가 사흘 동안의 싸움 끝에 큰 청새치를 잡는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멀어 결국 물고기의 뼈만 갖고 돌아온다.
뼈만 남은 물고기, 마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새로운 술기와 의료장비 등의 안정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민 건강보호와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 평가에 대한 활용이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는 ‘계륵(鷄肋)’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중복규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의료기기업체는 새로운 기술이 담긴 의료장비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통과해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신의료기술평가 시장 선진입 제도 간소화를 발표했다. 또 지난해에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평가 개선 추진을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임상적 근거라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본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입장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보건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신약 또는 신의료기기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처사다.
문제는 임상근거다.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새로운 기기로 충분한 임상근거를 축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문헌고찰이라는 검토방식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업체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 논문을 비롯한 충분한 임상적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의약품과 달리 RCT로 수행된 논문을 우선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로 신의료기술은 전통적인 의료기술평가에서 활용하던 임상적근거자료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임상현장에서 신의료기술이 어떻게 기능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복지부와 NECA의 선진입-후평가라는 카드가 아닌 ‘전주기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물론 NECA에서도 전주기 지원을 사업인 ‘길라잡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우선대상은 ▲개발 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 의료기술이며 분기별 15건 내외로 선정해 최대 6개월 동안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미국은 의료기술평가에서 명시적인 절차 및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연방정부에서 의료기술의 근거마련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 재정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연구 및 질 관리원(AHRQ)의 비교효과연구(CER)는 이러한 지원에 의한 의료기술 간의 비교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이며 사전 사후 시장의 다양한 정보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제도를 차용하는데 정작 중요한 사안이 왜 빠져 있는지 의문이다.
산티아고가 갖은 풍파를 견뎌내고 도착한 곳에는 앙상한 뼈만 남은 청새치밖에 없었다. 풍파로 인해 찢겨진 손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좀 샀으면 좋겠군.” 신의료기술에도 부디 행운이 뒤따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