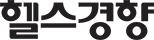혹시 당신은 낯선 타인에게 말을 걸었다가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반응에 민망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버스기사에게 ‘이 버스 OOO 가나요?’라고 물었다가 ‘안가요’라는 간단한 반응에 뒷걸음질 치며 다시 내려오던 당황스러움, 식당에서 ‘이모, 여기 물 좀 주세요’라고 했다가 ‘물은 셀프예요’라는 단호한 반응으로 인한 어색함.
누구든 유사한 경험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아마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자신이 뭔가 부탁해야하는 처지이거나 낯선 곳에서 헤매는 경우 상대방의 친절하지 않은 태도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민망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난다.

십여 년 전 새벽에 일어나 지방의 한 도시로 가야했다. 시외버스를 타기로 마음먹었는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첫차를 타야 했다. 부랴부랴 준비했는데도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기에는 아슬아슬했다. 이른 시각이고 주택가라 택시는 보이지 않았고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던 와중에 마을버스가 새벽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나타났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기사님. 이 버스, OOO정거장까지 얼마나 걸려요?”라고 머뭇거리며 물었다. 기사는 “왜요?”라고 무관심한 듯 말했다. 눈치를 살피며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굳은 표정으로 외쳤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후 속도를 좀 더 높였고 정류장에서 지체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보이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고마움을 전하자 그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며 연신 웃었다.
심리학의 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개인가치만큼이나 집단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권으로 분류하곤 한다.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지만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는 너그럽지 못하다. 그래서일까? 필자를 비롯한 우리네 이웃은 낯선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친절하지는 않다. 때로는 경계적이고 적대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낯선 이가 내 적이 아니라고 느끼면, 심지어 내 도움이 필요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의 빗장은 여지없이 풀리고 낯선 이는 더 이상 남이 아니다. 너와 나의 구분은 사라지고 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그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 내가 속한 집단의 덩치를 점점 더 크게 만들면 어떨까? 세세하게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눠 집단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경계할 적이 많아질 뿐이다. 그 구분을 줄이고 줄일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보통 이웃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그 구분과 기준을 허물어버린다는 점이다. 일상에서 우린 상대방이 나와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경계하는 것일 뿐이다. 짧은 미소, 작은 손짓만으로도 남이 내가 되는 일은 의외로 자주 일어난다.
<장은영 | 한양대 구리병원 교수>
(ⓒ 경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