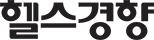얼마 전 위장질환으로 방문한 환자가 혹시 자신의 처방에 민들레가 들어가면 서양민들레 대신 토종민들레를 넣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필자는 단지 그냥 ‘네’ 하고 미소만 지었다. 환자분은 토종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부탁하신 것이었겠지만 사실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는 굳이 구별하지 않고 있다.
민들레는 세계적으로 2000여종에 달하며 그중 10여 종이 식용이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 고유종도 있다. 동의보감을 보면 ‘앉은뱅이’나 ‘므음드레’라는 한글이름이 있는데 ‘납작하다’와 ‘문드러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민들레의 생태를 보면 강풍이 휘몰아치거나 짓밟아도 죽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유럽에서도 민들레를 보면 강인한 동물을 떠 올렸다. 바로 사자다. 민들레를 영어로 ‘dandelion(덴델라이언)’이라고 하는데 민들레의 삐쭉한 잎이 사자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지은 것이다. 이는 프랑스어 ‘dent de lion(사자이빨)’에서 유래됐다.
한자어로는 포공영(蒲公英)이라고 한다. 아마도 민들레 포자가 부들처럼 부드럽고[포(蒲)] 한쪽으로 찌그러지지 않고 공평한[공(公)] 모양의 꽃봉오리[영(英)]처럼 보여 지은 것 같다. 약으로 사용할 때는 꽃이 피기 전 뿌리부터 줄기, 잎, 꽃봉오리 모두를 사용한다. 민들레는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염증억제효능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약초 중 하나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서양민들레는 바로 유럽산 민들레다. 유럽에서는 민들레와인, 루트비어(root beer), 청량음료의 재료로도 활용됐고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많이 만들어 먹었다. 약초로도 많이 활용됐는데 민들레뿌리는 잘게 잘라 볶은 후 차로 마시면 커피맛과 향이 나기 때문에 ‘민들레커피’라는 이름이 붙었다. 민들레커피는 18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양민들레는 노란색꽃, 토종민들레는 흰색꽃을 피운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를 꽃모양으로 구별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토종민들레도 노란색꽃이 있기 때문이다.
서양민들레는 짙은 노란색이고 토종민들레는 옅은 노란색이다. 동의보감에 나온 민들레(포공영) 편에는 ‘곳곳에서 난다. 음력 3~4월에 국화 비슷한 노란꽃이 핀다’라고 했다. 당시에는 흰꽃보다 노란꽃 토종민들레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이 둘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꽃을 싸고 있는 잎을 보면 된다. 토종민들레는 종처럼 감싸져 있고 서양민들레는 밖으로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다.
최근 들에서 민들레를 봤다면 십중팔구 서양민들레였을 것이다. 서양민들레가 눈에 쉽게 띄는 이유는 번식력이 좋기 때문이다. 국내에 유입된 지 100여년 만에 귀화식물로 적응도 잘했다. 서양민들레는 꽃 자체만으로도 자가수분이 가능한 반면 토종민들레는 벌 등의 도움으로 타가수분을 해야한다. 따라서 토종민들레는 번식을 위해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도 생겼다.
중요한 것은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의 효능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둘의 유효성분과 효능을 비교한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대한민국 한약공정서에도 포공영은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토종민들레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단지 심리적 위안일 뿐이다. 따라서 민들레가 주재료인 식품을 놓고 ‘토종’이나 ‘흰색’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민들레는 신토불이가 무색한 경우다. 서양민들레도 이미 우리 땅의 민들레가 돼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