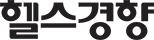필자는 수의사로 근무하며 반려동물의 죽음을 자주 접했다. 자연히 보호자의 여러 슬픔도 나누게 된다.
그중 9시간여 동안 7번이나 심장이 멈추며 죽음과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던 ‘비비안’의 보호자가 매우 마음 아파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난다. 벌써 7년 넘게 지났다.
또 2013년 8월 16일에 처음 만나 같은 해 9월 13일에 필자 품에서 숨을 거뒀던 ‘걸프’도 기억난다. 필자가 시행했던 첫 번째 안락사였다.
이렇듯 수의사는 많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 수밖에 없다.
4~5년 전 서울에서 페이닥터를 하던 시절이었다. 일하던 동물병원이 지역에서 꽤 큰 편이었던 탓에 중증질환을 앓는 반려동물을 참 많이 봤다. 그땐 잠드는 시간을 제외하곤 어떻게 동물을 살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 ‘한별이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자신에게 말해줄 만큼 최선을 다했던 시절이다.
그런데 그 시절 필자에게 좋지 못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 진료를 받으러 오는 반려동물을 질환으로만 보던 버릇이었다. ‘너는 무슨 병, 너는 무슨 병. 너는 이렇게 해야 낫고 너한테는 이런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하던 시절이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연재하던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라는 웹툰을 접하고나서 깨달은 점이 있다.
필자가 반려동물의 아픔을 생각지 못했다. 어떻게 치료할까에 몰두한 나머지 이 반려동물들이 한 집안의 가족이고 친구라는 생각을 못 했다. 이 반려동물들이 어떤 마음으로 치료받아서 가족 옆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병에서 낫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선진적인 의학적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후 필자는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의 사진을 찍어서 보호자에게 주기 시작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치료받다가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된 시추가 있었는데 장례과정을 도우면서 입원 중 찍었던 환자사진을 보호자에게 줬다. 그러자 보호자가 펑펑 우는 것이었다. 보호자는 환자가 살아 있을 때 사진을 찍어 놓지 못해 필자가 준 사진이 유일하다고 했다. 그때 ‘펫로스증후군’을 접했다.
반려동물을 잃을 때의 아픔은 자식이 죽을 때의 아픔의 정도와 같다고 한다. 사실 필자는 이런 아픔을 못 겪어 봤다. 가정에서 키우는 ‘미오’가 아직 12살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필자 손으로 심장병을 진단하고 펑펑 울기는 했지만 아직 이별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겪어 봤던 많은 아픔들을 떠올리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다.
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필자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오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느낀다. 이별해가는 과정을 인정하고 행복한 기억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면 펫로스증후군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필자는 이렇게 미오와의 이별을 준비하려고 한다.